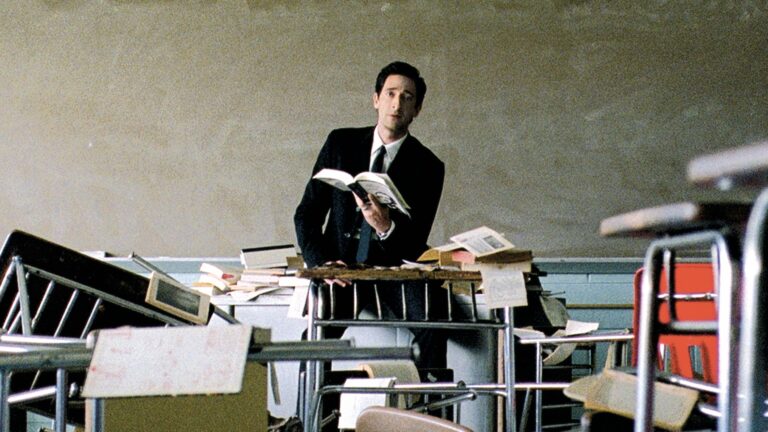영화의 백미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는 주말, 뭘 볼까 고민하다가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보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영화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 12시가 넘어 있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끔 영화 한 편이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화려한 액션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그저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보여줬을 뿐인데 말이죠.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제게는 바로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은 스크린 속 다니엘의 얼굴이, 그리고 그의 마지막 외침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묵직한 여운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내 볼까 해요.
영화는 평생을 뉴캐슬에서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면서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진단했지만, 정작 정부의 고용 지원 수당 평가에서는 ‘노동 가능’ 판정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질병 수당도, 구직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영화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건, 다니엘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평생 망치와 톱을 다뤄온 그에게 컴퓨터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정해진 절차와 규정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무원들, 수십 분을 기다려도 연결되지 않는 콜센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숫자로만 취급하는 차가운 관료주의의 벽 앞에서 다니엘은 점점 지쳐가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요.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싱글맘 케이티와 그녀의 두 아이를 만나게 돼요. 런던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낯선 뉴캐슬의 작은 아파트로 오게 된 케이티 가족 역시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죠. 관공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케이티를 다니엘이 도와주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특별한 연대를 쌓아가기 시작해요. 어쩌면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은 다니엘에게 케이티와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는지도 몰라요. 낡은 집을 수리해주고, 손수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며 온기를 나누는 모습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인간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를 연기한 배우 데이브 존스의 연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사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의 굳건함과 자존심, 그리고 시스템 앞에서 무력해져 가는 한 인간의 슬픔과 분노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표현해냈어요. 특히 그의 눈빛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처음에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의 눈빛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공허하고 지쳐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었죠. 케이티 역의 헤일리 스콰이어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특히 무료 급식소(푸드 뱅크) 장면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통조림을 허겁지겁 먹다가 터뜨리는 울음은, 자존심과 모성애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가장 처절한 순간을 보여주며 관객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아마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아요.
켄 로치 감독의 연출 방식도 이 영화의 진정성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는 마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처럼 인물들의 삶을 과장 없이, 담담하게 따라가요. 관객의 눈물을 쥐어짜기 위한 극적인 배경 음악이나 현란한 카메라 기법 같은 건 전혀 사용하지 않죠. 대신 영국의 날씨처럼 흐리고 차가운 색감의 화면과 실제 뉴캐슬 지역 주민들을 배우로 기용하는 등,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요. 이러한 연출 덕분에 우리는 다니엘과 케이티의 이야기가 스크린 속 허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그들의 이웃이 되어 이 모든 상황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영화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의 제목이자, 다니엘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이름. 그것은 단순히 그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그가 차가운 관공서 외벽에 스프레이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장면은 이 영화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에 의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서류 뭉치 속 하나의 사례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저항이었죠. 우리는 과연 서로를 이름으로 불러주고,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을까요? 영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분명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보는 내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또 너무나 슬퍼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서류나 차가운 규정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내미는 손길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함께 분노하고, 작은 연대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깊은 울림을 받게 되실 거예요.